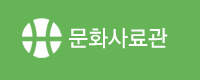home  문화사료관
문화사료관  마을기행
마을기행
마을기행
제천문화원 마을기행 입니다.
제천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 볼 수 있는 게시판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제천의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화 지역적 특성과 산물 등을 알려드립니다.
[백운면] 애련리[愛蓮里]
글쓴이 :
문화원
(조회 : 1,719)
애련리는 본래 제천군 원서면 지역으로서, ‘알연(戛然)’ 또는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애련리(愛蓮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장금리(長琴里), 길현리(吉峴里), 대티리(大티里) 등을 병합하여 애련리라 하여 백운면에 편입되었다. 1980년 4월 1일 제천시 승격으로 인하여 제원군 백운면 애련이라 하다가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따라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가 되었다.
애련1리는 마을의 지형 생김이 연꽃이 물에 떠있는 형상이라 하여 애련이라 불릴 정도로 유구한 역사가 숨어있는 마을이다. 천등산이 있고 울고 넘는 박달재의 시랑산 끝자락에 자리한 소담하고 안락한 마을이다. 마을면적은 444.5ha이며, 논은 23ha, 밭은 54.3ha이다. 인구수는 143명, 가구 수는 58가구이다. 특산물로 고추 등이 있다.
애련2리는 백운면 소재지에서 약 9Km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등산과 대덕산 자락에 포근히 둘러싸인 곳으로, 자연마을로는 한치, 윗한치, 진소, 장재덕 등이 있다. 백운천과 진소천이 만나는 합소를 앞에 마을 앞에 두고, 마을에는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다. 이곳에서 약11Km쯤 가면 진소마을 앞에는 충북선 열차가 지나가는 데, 이곳이 영화 <박하사탕> 촬영지이다. 마을면적은 318.4ha이며, 논은 13ha, 밭은 49ha이다. 인구수는 43명, 가구수는 21가구이다. 특산물로는 고추, 참깨 등이 있다.
● 고양텃골[고양대곡] : 애련리에 있는 골짜기. 고려 공양왕(恭讓王)이 잠시 머물렀다고 함.
● 공양대곡(恭讓垈谷) → 고양텃골.
● 구정모랭이(舊廷-) : 애련리에 있는 모롱이. 고려 공양왕(恭讓王)이 지난 곳이라 함.
● 길현(吉峴) : 질고개.
● 당고개¹(堂峴) : 당고개 밑에 있는 마을.
● 당고개²(堂峴) : 질고개 북쪽에서 평동리로 가는 고개.
● 당현(堂峴)¹ → 당고개.
● 당현(堂峴)² → 당고개.
● 대티(大峙)¹ → 한티.
● 대티(大峙)² → 한티.
● 말등바우 : 당고개 앞에 있는 바위. 말등처럼 생겼다고 함.
● 상대티(上大峙) : 웃 한티.
● 웃한티[상대티] : 한티 위쪽에 있는 마을.
● 장금 → 장금터.
● 장금대(長琴垈) → 장금터.
● 장금터[장금, 장금터] : 애련 동남쪽에 있는 마을. 신라 때 우륵(于勒)이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춤, 노래, 가야금을 가르쳤다고 함.
● 장자더기 : 진소 북쪽에 있는 마을. 장자가 살았다고 함.
● 지루고개¹ → 질고개.
● 지루고개² → 질고개.
● 진소¹ : 한티 동남쪽에 있는 마을. 앞에 진소가 있음.
● 진소² : 한티 동남쪽에 있느 긴 소.
● 질고개¹[지루고개, 길현리] : 질고개 밑에 있는 마을.
● 질고개²[길현, 지루고개] : 애련리 서북쪽에 있는 고개, 질고개에서 평동리로 감.
● 한티¹[대티] : 한티 밑에 있는 마을.
● 한티²[힌팃재, 대티] : 웃한티 북쪽에 있는 큰 고개. 애련리에서 봉양면 원박리로 감. 조선 시대 청풍(淸風) 고을로 가는 관행 길이었음.
● 한팃재 → 한티.
◎ 애련리 문화유산
● 장금터 보호수
장금터 보호수는 2003년 4월 제천시 보호수 제 69호로 지정된 소나무다. 수령은 약 250년 정도 되었으며, 나무의 높이는 8m, 둘레는 2m이다.
● 질고개 산지당(山地堂)
산고사는 매년 음력 7월 3일 낮 10시 30분경에 지낸다. 전에는 밤 12시 가까이 지냈으나. 현재는 젊은 사람이 없어 낮에 지낸다. 몇 년 전 장마에 당집이 떠내려가고, 현재는 바위만 남아있다. 마을에서 강을 건너야 하는 곳에 있으므로 비가 오면 강 건너편에서 당집을 바라보고 제를 지내고, 물이 적을 경우에는 건너가서 산고사를 지냈다. 질고개 천등산 산고사는 생기를 보아 제관 및 고양주 각각 한 명씩 뽑아 지내며, 제의의 진행은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 소지 – 음복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뫼⦁나물⦁탕⦁밤⦁대추⦁곶감 등을 쓰며, 술은 3일전에 산지당 근처에 묻어서 익힌다고 한다. 산지당 위에는 용바위가 있는데, 그 곳에서 가물었을 때 개를 잡아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 한치 보호수
제천시 보호수 제70호로 2003년 4월에 지정된 느티나무다. 수령은 약 350여 년 되었으며, 나무의 높이는 16m, 둘레는 6.3m이다. 한치 마을에서 진소 마을로 넘어가는 길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축대를 쌓아 놓았다.
● 한치 산제당(山祭堂)
당집은 없으며 소나무와 바위에 금줄이 쳐져있고, 느릅나무에 한지를 묶어 놓았다. 마을 주민들은 산제당이 있는 곳을 ‘산제당골’로 부른다. 한지 산제당에서의 당고사에는 애련2리 마을 주민들 모두 참석한다. 웃한치 마을 주민들도 마을에서 14일날 당고사를 자체적으로 지낸 다음 15일날 한치 산제당 당고사에 참석한다. 당고사는 매년 음력 정월 15일 6시쯤에 지낸다. 제물로는 돼지머리⦁백설기 한 시루⦁포⦁밤⦁대추⦁곶감 등을 진설한다. 당고사는 제관 및 축관, 고양주를 선정하면서 시작이 된다. 고양주로 선출된 집에서는 금줄을 쳐 금기를 지킨다. 제의의 진행은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 소지 – 음복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애련리 이야기
⦁장금대(長禁垈)와 명암(鳴岩)의 유래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에 ‘장금터’가 있고 조금 떨어진 냇물 가운데 ‘명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신라진흥왕은 낭비성에서 가야 사람 우륵이 타는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듣고 기뻐하여 우륵에게 새로운 곡을 만들게 하는 한편 계고 (階古), 법지(法知), 만덕(萬德) 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하였다.
우륵은 세 사람에게 각각 가야금과 노래와 춤을 가르쳐 주었다. 충주 탄금대에 있으면서 계고에세 가야금을, 법지에게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친 것 이다. 우륵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장금터에 와서 거문고와 노래와 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계곡의 물소리와 그리고 가야금 소리가 한데 어울려 하나의 선경을 이루었다.
우륵이 이곳을 떠난 다음에는 화창한 날씨면 냇물의 바위가 마치 우륵의 가야금 소리를 낸다고 한다. 사람들은 우륵이 게 제자를 가르쳤던 곳을 ‘장금터’라 하였고, 가야금 소리를 내는 바위를 ‘명암’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고려시대 공양왕이 공양터골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악사(樂士)를 시켜서 가야금을 연주하도록 한 곳이라고도 하며, 공양왕의 행궁(行宮)자리라고도 한다.
⦁매바위의 유래
백운면 애련리에 ‘한티’ 또는 ‘대티’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한티 북쪽에 봉양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한티재’라 부른다. 이 한티재 길가에 매바위가 있다.
옛날 한티마을에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사는 지씨가 살고 있었다. 원래 잘사는 집이기 때문에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씩 묵어가는 식객도 날마다 몇 명씩 되었다. 지씨 내외는 하도 손님이 많고 귀찮아 손님을 끊는 수가 없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하루는 스님이 지씨 대문 앞에 와서 시주를 청했다. 지씨 부인은 그렇잖아도 손님이 많아 괴로울 판인데, 스님까지 와서 시주하라고 하니 짜증스러워 본체만체했다. 그러나 스님은 계속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돌아갈 기색이 없었다. 부인은 스님에게 손님이 하도 많아 먹을 것이 떨어져 스님께 드릴 곡식이 한 톨도 없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한동안 우두커니 있다가, 부인에게 “그럼 손님이 끊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까?” 하고 물었다. 부인은 그 말에 솔깃하여 금방 얼굴색이 달라지더니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스님은 동네 앞에 있는 매 모양 바위의 부리 부분을 끊어내라고 이르더니 홀연히 가버리는 것이다. 지씨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며 당장 사람을 데리고 매비위에 가서 부리 부분을 부수어 놓았다. 과연 그런 뒤로는 지씨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뚝 끊어졌다.
그와 함께 가세도 점점 쇠퇴하여 가더니 마침내는 몰락하여 동네를 떠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매의 부리를 없앴으니 멋이를 먹지 못하는 꼴이 되어 결국 지씨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도 부리가 없어진 매바위가 서있으나 다시 바위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애련의 노래
⦁애련아라리
웃한치 뒷산에 곤들래 딱죽이 낙염이만 같다면
병자년 흉년에도나 봄 장 살어 왔구나
◎영화 <박하사탕> 촬영지 – 진소마을
<박하사탕> 영화의 촬영지인 진소마을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싶은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진소마을은 기차가 가끔 기적을 울리며 지나갈 때만 빼고는 인적이 드문, 앞뒤 전체가 산으로 둘러진 아주 조용한 산간벽지 마을이다. 앞에는 냇가가 흐르며 냇가 양쪽으로 울창한 산림이 있어 가슴속까지 시원한 맑은 공기로 가득한 마을이다 워낙 산간벽지 시골이라 도로가 좋지 않아 마을 어귀까지 버스가 다니지는 않지만 승용차 이용은 가능하다. 백운에서 진소마을까지 산과 냇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도심의 생활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여정이 된다.
진소마을 백운면 소재지에서 제천-충주간 도로를 가로질러 아래쪽으로 뚫린 질을 접어들면 애련리로 향하게 된다. 백운면 소재지에서 약 4km의 포장된 도로를 지나면, 도로 옆 우측에 400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벤치가 놓여있고, 왼쪽에는 애련분교 자리에 원서문학관이 다람스레 자리하고 있다. 촬영지는 이곳에서 느티나무 앞을 지나 약 2km 의 비포장도를 더 들어가야 한다. 진소마을 아래쪽으로 100녀 미터 쯤에 철길과 함께 진소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가. 언덕위에 아담스럽게 조성된 진소마을에는 모두 4가구 11명이 살고 있으며, 천등산(807m)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주포천’으로 불려지던 이곳은 영화 <박하사탕>의 내용 중에서 모래사장의 야유회 장소 이름을 따라 ‘진소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영화 <박하사탕>은 뒤틀린 한국 정치사의 시대적 폭력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게 상처로 남는가를 훌륭하게 표현해 낸 작품이다. 20년에 걸친 한 남자의 인생역정을 그린 이 영화는 순수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절망과 환멸로 몸부림치게 되는지 7개의 에피소드마다 인과론적 고리로 연결한 정교한 구성으로 관객에게 선명한 주제를 보여준다. 설경구의 광기어린 연기가 강한 인상으로 남는 영화 <박하사탕>은 386세대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만한 임기와 감독 특유의 깊이 있는 연출력, 주연들의 흡입력 있는 연기가 관객들에게 짙은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 <박하사탕>은 386세대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만한 이야기와 감독 특유의 깊이 있는 연출력, 주연들의 흡입력 있는 연기가 관객들에게 짙은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 <박하사탕>은 제 4회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올려져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고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이창동 감독연출,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이 출연한 작품으로 국내에서 2000년 1월 개봉 25일 만에 50 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박하사탕>은 주인공 ‘영호’가 철교 위에서 달리는 기차를 막아서며 “나 다시 돌아갈래!”하고 소리치며 기적소리에 묻혀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시작 한다. 20년 전 첫사랑 연인과 함께 진소천 모래사장에 소풍갔던 곳을 다시 찾아와 잃어버린 어린 시절 꿈과, 야망, 사랑을 20년의 지난 세월이 모두 앗아가 버렸음을 깨닫고 가장 순수했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원서문학관(遠西文學館)
한국시인협회 회장이며, 고려대 교수로 30년간 재직하다가 2007년 8월말로 정년퇴직한 오탁번시인이 2004년 3월에 자신의 모교인 백운초등학교의 폐교된 얘련분교를 매입하여 꾸민 문학관이다. ‘원서(遠西)’란 백운면의 조선시대 지명으로 제천에서 가장 멀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교실 입구에는
‘원서헌‘ 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교실 내부는 오탁번 시인의 사무실 겸 창작실로 아담하게 꾸며졌다. 사무실 한쪽에는 오시인이 정성스럽게 모은 골동품과 각종 패들이 진열되어 있다. 오시인이 직접 붓으로 쓴 ’春日’ 이라는 시도 보인다. 복도벽에는 우리나라 대표시인들의 육필원고들이 걸려 있다. 유명시인들의 사진과 프로필도 걸려 있다. 원서문학관은 전에 학교였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다.
애련1리는 마을의 지형 생김이 연꽃이 물에 떠있는 형상이라 하여 애련이라 불릴 정도로 유구한 역사가 숨어있는 마을이다. 천등산이 있고 울고 넘는 박달재의 시랑산 끝자락에 자리한 소담하고 안락한 마을이다. 마을면적은 444.5ha이며, 논은 23ha, 밭은 54.3ha이다. 인구수는 143명, 가구 수는 58가구이다. 특산물로 고추 등이 있다.
애련2리는 백운면 소재지에서 약 9Km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등산과 대덕산 자락에 포근히 둘러싸인 곳으로, 자연마을로는 한치, 윗한치, 진소, 장재덕 등이 있다. 백운천과 진소천이 만나는 합소를 앞에 마을 앞에 두고, 마을에는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다. 이곳에서 약11Km쯤 가면 진소마을 앞에는 충북선 열차가 지나가는 데, 이곳이 영화 <박하사탕> 촬영지이다. 마을면적은 318.4ha이며, 논은 13ha, 밭은 49ha이다. 인구수는 43명, 가구수는 21가구이다. 특산물로는 고추, 참깨 등이 있다.
● 고양텃골[고양대곡] : 애련리에 있는 골짜기. 고려 공양왕(恭讓王)이 잠시 머물렀다고 함.
● 공양대곡(恭讓垈谷) → 고양텃골.
● 구정모랭이(舊廷-) : 애련리에 있는 모롱이. 고려 공양왕(恭讓王)이 지난 곳이라 함.
● 길현(吉峴) : 질고개.
● 당고개¹(堂峴) : 당고개 밑에 있는 마을.
● 당고개²(堂峴) : 질고개 북쪽에서 평동리로 가는 고개.
● 당현(堂峴)¹ → 당고개.
● 당현(堂峴)² → 당고개.
● 대티(大峙)¹ → 한티.
● 대티(大峙)² → 한티.
● 말등바우 : 당고개 앞에 있는 바위. 말등처럼 생겼다고 함.
● 상대티(上大峙) : 웃 한티.
● 웃한티[상대티] : 한티 위쪽에 있는 마을.
● 장금 → 장금터.
● 장금대(長琴垈) → 장금터.
● 장금터[장금, 장금터] : 애련 동남쪽에 있는 마을. 신라 때 우륵(于勒)이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춤, 노래, 가야금을 가르쳤다고 함.
● 장자더기 : 진소 북쪽에 있는 마을. 장자가 살았다고 함.
● 지루고개¹ → 질고개.
● 지루고개² → 질고개.
● 진소¹ : 한티 동남쪽에 있는 마을. 앞에 진소가 있음.
● 진소² : 한티 동남쪽에 있느 긴 소.
● 질고개¹[지루고개, 길현리] : 질고개 밑에 있는 마을.
● 질고개²[길현, 지루고개] : 애련리 서북쪽에 있는 고개, 질고개에서 평동리로 감.
● 한티¹[대티] : 한티 밑에 있는 마을.
● 한티²[힌팃재, 대티] : 웃한티 북쪽에 있는 큰 고개. 애련리에서 봉양면 원박리로 감. 조선 시대 청풍(淸風) 고을로 가는 관행 길이었음.
● 한팃재 → 한티.
◎ 애련리 문화유산
● 장금터 보호수
장금터 보호수는 2003년 4월 제천시 보호수 제 69호로 지정된 소나무다. 수령은 약 250년 정도 되었으며, 나무의 높이는 8m, 둘레는 2m이다.
● 질고개 산지당(山地堂)
산고사는 매년 음력 7월 3일 낮 10시 30분경에 지낸다. 전에는 밤 12시 가까이 지냈으나. 현재는 젊은 사람이 없어 낮에 지낸다. 몇 년 전 장마에 당집이 떠내려가고, 현재는 바위만 남아있다. 마을에서 강을 건너야 하는 곳에 있으므로 비가 오면 강 건너편에서 당집을 바라보고 제를 지내고, 물이 적을 경우에는 건너가서 산고사를 지냈다. 질고개 천등산 산고사는 생기를 보아 제관 및 고양주 각각 한 명씩 뽑아 지내며, 제의의 진행은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 소지 – 음복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뫼⦁나물⦁탕⦁밤⦁대추⦁곶감 등을 쓰며, 술은 3일전에 산지당 근처에 묻어서 익힌다고 한다. 산지당 위에는 용바위가 있는데, 그 곳에서 가물었을 때 개를 잡아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 한치 보호수
제천시 보호수 제70호로 2003년 4월에 지정된 느티나무다. 수령은 약 350여 년 되었으며, 나무의 높이는 16m, 둘레는 6.3m이다. 한치 마을에서 진소 마을로 넘어가는 길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축대를 쌓아 놓았다.
● 한치 산제당(山祭堂)
당집은 없으며 소나무와 바위에 금줄이 쳐져있고, 느릅나무에 한지를 묶어 놓았다. 마을 주민들은 산제당이 있는 곳을 ‘산제당골’로 부른다. 한지 산제당에서의 당고사에는 애련2리 마을 주민들 모두 참석한다. 웃한치 마을 주민들도 마을에서 14일날 당고사를 자체적으로 지낸 다음 15일날 한치 산제당 당고사에 참석한다. 당고사는 매년 음력 정월 15일 6시쯤에 지낸다. 제물로는 돼지머리⦁백설기 한 시루⦁포⦁밤⦁대추⦁곶감 등을 진설한다. 당고사는 제관 및 축관, 고양주를 선정하면서 시작이 된다. 고양주로 선출된 집에서는 금줄을 쳐 금기를 지킨다. 제의의 진행은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 소지 – 음복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애련리 이야기
⦁장금대(長禁垈)와 명암(鳴岩)의 유래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에 ‘장금터’가 있고 조금 떨어진 냇물 가운데 ‘명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신라진흥왕은 낭비성에서 가야 사람 우륵이 타는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듣고 기뻐하여 우륵에게 새로운 곡을 만들게 하는 한편 계고 (階古), 법지(法知), 만덕(萬德) 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하였다.
우륵은 세 사람에게 각각 가야금과 노래와 춤을 가르쳐 주었다. 충주 탄금대에 있으면서 계고에세 가야금을, 법지에게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친 것 이다. 우륵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장금터에 와서 거문고와 노래와 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계곡의 물소리와 그리고 가야금 소리가 한데 어울려 하나의 선경을 이루었다.
우륵이 이곳을 떠난 다음에는 화창한 날씨면 냇물의 바위가 마치 우륵의 가야금 소리를 낸다고 한다. 사람들은 우륵이 게 제자를 가르쳤던 곳을 ‘장금터’라 하였고, 가야금 소리를 내는 바위를 ‘명암’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고려시대 공양왕이 공양터골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악사(樂士)를 시켜서 가야금을 연주하도록 한 곳이라고도 하며, 공양왕의 행궁(行宮)자리라고도 한다.
⦁매바위의 유래
백운면 애련리에 ‘한티’ 또는 ‘대티’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한티 북쪽에 봉양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한티재’라 부른다. 이 한티재 길가에 매바위가 있다.
옛날 한티마을에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사는 지씨가 살고 있었다. 원래 잘사는 집이기 때문에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씩 묵어가는 식객도 날마다 몇 명씩 되었다. 지씨 내외는 하도 손님이 많고 귀찮아 손님을 끊는 수가 없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하루는 스님이 지씨 대문 앞에 와서 시주를 청했다. 지씨 부인은 그렇잖아도 손님이 많아 괴로울 판인데, 스님까지 와서 시주하라고 하니 짜증스러워 본체만체했다. 그러나 스님은 계속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돌아갈 기색이 없었다. 부인은 스님에게 손님이 하도 많아 먹을 것이 떨어져 스님께 드릴 곡식이 한 톨도 없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한동안 우두커니 있다가, 부인에게 “그럼 손님이 끊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까?” 하고 물었다. 부인은 그 말에 솔깃하여 금방 얼굴색이 달라지더니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스님은 동네 앞에 있는 매 모양 바위의 부리 부분을 끊어내라고 이르더니 홀연히 가버리는 것이다. 지씨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며 당장 사람을 데리고 매비위에 가서 부리 부분을 부수어 놓았다. 과연 그런 뒤로는 지씨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뚝 끊어졌다.
그와 함께 가세도 점점 쇠퇴하여 가더니 마침내는 몰락하여 동네를 떠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매의 부리를 없앴으니 멋이를 먹지 못하는 꼴이 되어 결국 지씨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도 부리가 없어진 매바위가 서있으나 다시 바위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애련의 노래
⦁애련아라리
웃한치 뒷산에 곤들래 딱죽이 낙염이만 같다면
병자년 흉년에도나 봄 장 살어 왔구나
◎영화 <박하사탕> 촬영지 – 진소마을
<박하사탕> 영화의 촬영지인 진소마을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싶은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진소마을은 기차가 가끔 기적을 울리며 지나갈 때만 빼고는 인적이 드문, 앞뒤 전체가 산으로 둘러진 아주 조용한 산간벽지 마을이다. 앞에는 냇가가 흐르며 냇가 양쪽으로 울창한 산림이 있어 가슴속까지 시원한 맑은 공기로 가득한 마을이다 워낙 산간벽지 시골이라 도로가 좋지 않아 마을 어귀까지 버스가 다니지는 않지만 승용차 이용은 가능하다. 백운에서 진소마을까지 산과 냇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도심의 생활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여정이 된다.
진소마을 백운면 소재지에서 제천-충주간 도로를 가로질러 아래쪽으로 뚫린 질을 접어들면 애련리로 향하게 된다. 백운면 소재지에서 약 4km의 포장된 도로를 지나면, 도로 옆 우측에 400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벤치가 놓여있고, 왼쪽에는 애련분교 자리에 원서문학관이 다람스레 자리하고 있다. 촬영지는 이곳에서 느티나무 앞을 지나 약 2km 의 비포장도를 더 들어가야 한다. 진소마을 아래쪽으로 100녀 미터 쯤에 철길과 함께 진소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가. 언덕위에 아담스럽게 조성된 진소마을에는 모두 4가구 11명이 살고 있으며, 천등산(807m)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주포천’으로 불려지던 이곳은 영화 <박하사탕>의 내용 중에서 모래사장의 야유회 장소 이름을 따라 ‘진소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영화 <박하사탕>은 뒤틀린 한국 정치사의 시대적 폭력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게 상처로 남는가를 훌륭하게 표현해 낸 작품이다. 20년에 걸친 한 남자의 인생역정을 그린 이 영화는 순수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절망과 환멸로 몸부림치게 되는지 7개의 에피소드마다 인과론적 고리로 연결한 정교한 구성으로 관객에게 선명한 주제를 보여준다. 설경구의 광기어린 연기가 강한 인상으로 남는 영화 <박하사탕>은 386세대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만한 임기와 감독 특유의 깊이 있는 연출력, 주연들의 흡입력 있는 연기가 관객들에게 짙은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 <박하사탕>은 386세대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만한 이야기와 감독 특유의 깊이 있는 연출력, 주연들의 흡입력 있는 연기가 관객들에게 짙은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 <박하사탕>은 제 4회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올려져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고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이창동 감독연출,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이 출연한 작품으로 국내에서 2000년 1월 개봉 25일 만에 50 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박하사탕>은 주인공 ‘영호’가 철교 위에서 달리는 기차를 막아서며 “나 다시 돌아갈래!”하고 소리치며 기적소리에 묻혀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시작 한다. 20년 전 첫사랑 연인과 함께 진소천 모래사장에 소풍갔던 곳을 다시 찾아와 잃어버린 어린 시절 꿈과, 야망, 사랑을 20년의 지난 세월이 모두 앗아가 버렸음을 깨닫고 가장 순수했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원서문학관(遠西文學館)
한국시인협회 회장이며, 고려대 교수로 30년간 재직하다가 2007년 8월말로 정년퇴직한 오탁번시인이 2004년 3월에 자신의 모교인 백운초등학교의 폐교된 얘련분교를 매입하여 꾸민 문학관이다. ‘원서(遠西)’란 백운면의 조선시대 지명으로 제천에서 가장 멀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교실 입구에는
‘원서헌‘ 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교실 내부는 오탁번 시인의 사무실 겸 창작실로 아담하게 꾸며졌다. 사무실 한쪽에는 오시인이 정성스럽게 모은 골동품과 각종 패들이 진열되어 있다. 오시인이 직접 붓으로 쓴 ’春日’ 이라는 시도 보인다. 복도벽에는 우리나라 대표시인들의 육필원고들이 걸려 있다. 유명시인들의 사진과 프로필도 걸려 있다. 원서문학관은 전에 학교였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다.